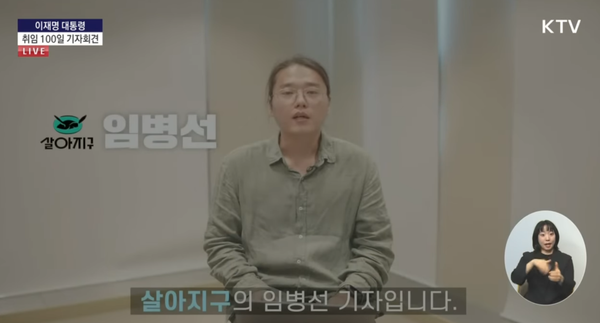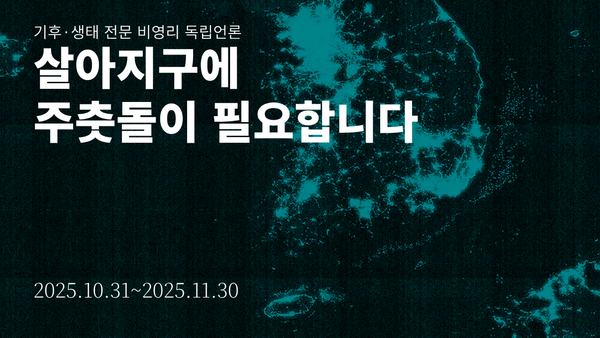
살아지구 후원회원 모집 캠페인
살아지구의 출입처는
자연입니다
지난 1년 살아지구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발전소가 가동한 이후 수십년 동안 온배수가 일으킨 문제는 ‘열’에 한정됐습니다. 모든 보상, 분쟁이 온배수가 수온을 상승시키는 효과에만 근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지구는 바다에 남은 소독제를 찾았고, 온배수 문제의 새 국면을 제시했습다. ‘화학물질’이다. 핵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락스의 원료, 차아염소산나트륨입니다.
‘정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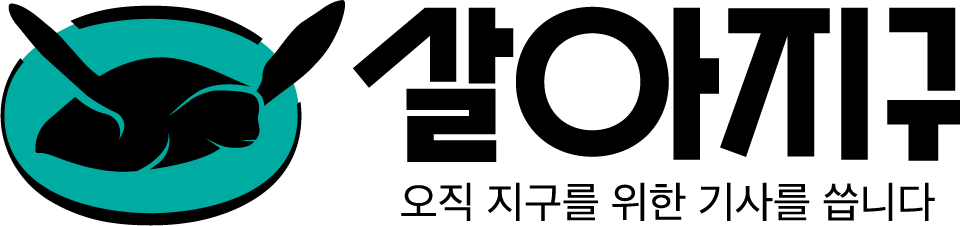

![[기훗기훗]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탄소 사업'들](/content/images/size/w600/2025/1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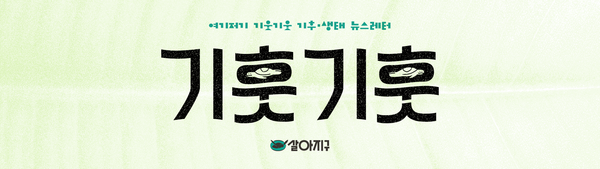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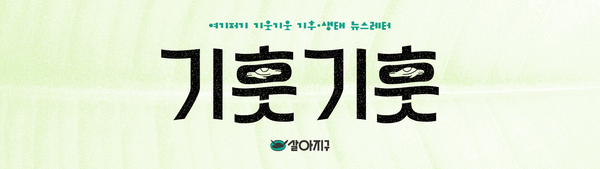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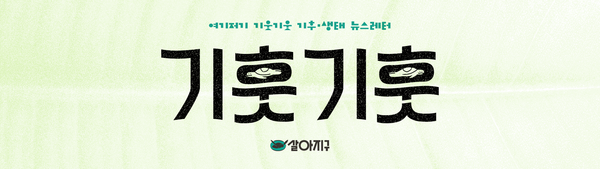

![[기훗기훗] 이재명 정부의 기후 대응 전략](/content/images/size/w600/2025/10/IMG_5374.jpeg)
![[취재수첩] "바다만 원래대로 돌아오면 보상이고 뭐고"](/content/images/size/w600/2025/09/DSC01401.JPG)
![살아지구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알아보기 [기훗기훗 9월 4주차]](/content/images/size/w600/2025/09/--------------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