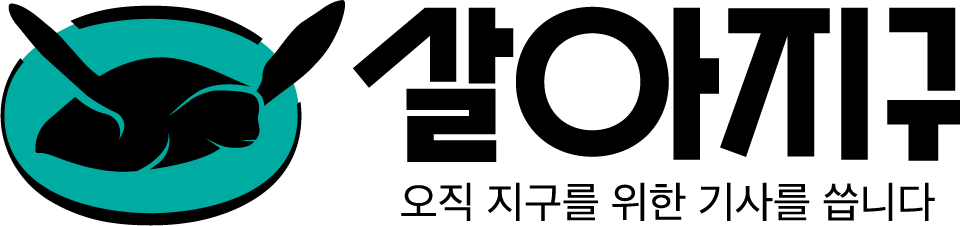환경영향평가 없이 강바닥 파헤치는 준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대대적인 하천공사를 벌였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시 3대 하천인 대전천, 갑천, 유등천 주변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하천공사를 시작했다. 공사의 주 내용은 강 바닥에 있는 흙과 자갈 등을 퍼내 깊숙하게 만드는 준설이다. 준설은 강에서 물이 흐르는 공간을 넓히기 때문에 모래나 흙이 자주 쌓이는 일부 구간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원래 흙이나 모래가 자주 쌓이는 하천이라면 준설을 자주 해야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
준설이 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완옥 민물고기보존협회장은 “하천 준설은, 인간으로 본다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동네를 철거하는 것과 같다. 자기가 살던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 어떤 민물고기도 준설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고 <살아지구>에 말했다. 이어 “준설 전과 후를 비교하면 살아남은 물고기가 30% 이하로 떨어졌다가 회복하더라도 80%로 돌아갈 수 없다. 10종이 있던 곳에 1~2종만 남고, 회복하더라도 8종이 되지는 않는다. 1~2종은 멸종위기종이나 생태적으로 민감한 종이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유등천, 멸종위기 감돌고기 복원 지역
특히 대전 3대 하천 중 유등천은 멸종위기 어류인 감돌고기의 얼마 남지 않은 서식지이며, 대전광역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감돌고기 서식지 복원을 하던 곳이다. 심지어 공사가 이뤄지는 곳 중 하나인 수련교 인근은 대전광역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500마리에서 2000마리씩 어린 감돌고기를 직접 풀어놓은 곳이다. 이들은 방류 당시 ‘멸종위기 I급 감돌고기 서식지 복원을 위한 방류행사’라는 명칭을 내걸었다.
유등천은 감돌고기를 방류하는 주요 지점이었다. 감돌고기는 주로 금강에 사는데, 본류에서는 대청댐 설치 이후 수가 급감했고 지류인 유등천과 웅천천이 서식지로 남아있다. 특히 유등천은 금강 상류에서 물을 막는 대청댐 아래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감돌고기 서식지다.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원,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센터 방인철 교수가 2024년 8월 한국수생태학회지에 발표한 ‘유등천의 어류군집 특성과 멸종위기어류 감돌고기의 서식양상’ 논문은 하천공사가 감돌고기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연구진은 “유등천 전체 구간에서 크고 작은 하천공사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대를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하천공사를 하고 나면 기존에 살던 물고기 중 깊고 물길이 느린 곳을 좋아하는 물고기인 큰납지리, 강준치, 얼룩동사리, 블루길 등이 살아남는다.
이완옥 민물고기보존협회장은 “감돌고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다. 사는 장소를 볼 때 특이성이 있는 종이다. (감돌고기가 사는 곳에) 꺽지가 있어야 하고 수질이 양호하고 주변에 돌도 있어야 한다. 그런 지역에서만 사는데 준설을 한다면 자갈이나 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꺽지도 사라져 완전히 멸종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감돌고기는 다른 민물고기인 꺽지가 알을 낳은 둥지에 몰래 알을 낳는다.
이 협회장은 “유등천은 도시 하천 중에서도 감돌고기가 살아남을 수 있던 곳이기에 방류도 하고 복원도 했다.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어류 전문가들이 관심 있게 보는 곳이다. 그 하천조차 살아남지 못한다면 나머지 하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돌고기는 자갈이 깔린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선호한다. 바닥을 파내 물길을 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준설은, 필연적으로 특정 생물 서식지를 파괴한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감돌고기 멸종위기 이유 중 두 번째로 큰 이유가 하천공사다. 첫 번째는 댐이나 보 건설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12년 12월 발간한 ‘금강에 서식하는 감돌고기의 서식실태 조사’를 통해 “최근 하천공사 등으로 감돌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장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대전시에 흐르는 유등천은 그 서식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시 없는 준설
하천공사는 강 생태계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하천공사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환경부 승인을 얻는 절차다. 사업 규모가 작을 경우 평가 항목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대전광역시의 대전천, 갑천, 유등천 하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했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하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 측은 “대전 3대 하천 공사의 경우,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한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하천정비와 같이 하천기본계획 등에 반영한 사업이 아닌 ‘유지준설’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유지준설이 공식 구분 방식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지자체가 하천을 정리할 목적으로 낮은 강도의 공사를 할 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하천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승인받기 전에 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3대 하천 공사는 환경부가 권한을 위임한 대전광역시가 하는 공사라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중 금강유역환경청이 내세우는 조항은 하천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하천의 유지, 보수는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다.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하천관리청에 해당한다.
대전광역시가 20km가 넘는 구간을 준설한 것을 ‘경미한 하천공사’로 볼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총 20개로 나눠 발주한 대전광역시의 하천공사 대상 구역 길이는 모두 20.7㎞다. 나중에 추가 발주한 4개 지구를 더하면 규모는 늘어난다.
<살아지구> 취재 결과, 대전 3대 하천에 비해 규모는 훨씬 작지만 특징이 비슷한 준설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례를 발견했다. 함평군이 관리하는 국가 하천인 함평천은 2024년 9월부터 준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났다. 대전 3대 하천 사례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 승인을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함평천 준설 공사 승인권자도 함평군이었다. 목적도 ‘재해예방’으로 대전광역시 사례와 같고, 준설 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공사라는 점도 같다. 공사 대상 하천의 길이는 411m, 면적은 1만 1990㎡로 대전 3대 하천 준설과 비교하면 훨씬 작다.
하천 411m 준설과 최소 20.7km의 준설 중 어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지는 분명하다. 환경부가 하천법을 대전 3대 하천 사례처럼 해석한다면, 실제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준설을 환경영향평가로 감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환경영향평가 목적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준설이 홍수 피해 예방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2023년부터 대전광역시를 포함해 전주시, 안양시 등 많은 지자체장은 준설을 해야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준설 공사를 했다.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흙이 많이 쌓인 상황이 홍수 피해 원인이 돼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매년 홍수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홍수피해상황조사’는 대부분의 홍수 피해 원인을 제방과 호안 부실로 지목한다. 제방은 하천을 따라 형성한 물을 막는 시설이며, 호안은 제방을 양 옆에서 받치는 구조물이다.
대전광역시는 흙이나 모래 등 퇴적물이 하천 바닥에 쌓여 지난해(2024년) 집중호우 때 홍수 위험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준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매년 홍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분석해 내놓는 홍수피해상황조사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대전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12건 중 준설이 필요하다고 한 사례는 2건뿐이다. 갑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9건 중 준설 필요 의견을 낸 사례는 없다. 유등천의 경우는 모두 금산군에서만 발생했다. 다른 대부분의 피해 구간은 호안과 제방을 원래 설계대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만 있다.
임병선 기자 bs@disappearth.org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