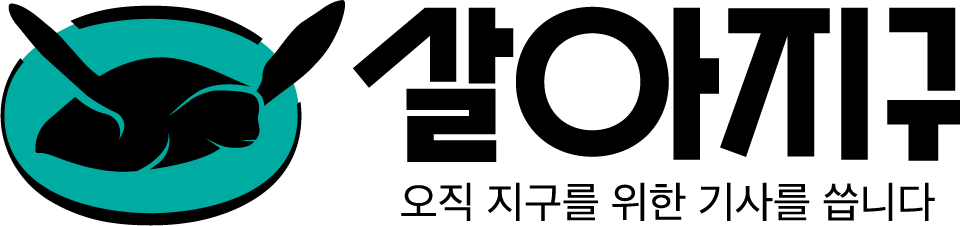12월 3주차 기훗기훗
이번 주의 시작은 잘 보내셨는지요. 모두들 저번 주 월요일에 비해 긴장이 조금 풀어졌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비록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는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그 여파는 끝나지 않고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생태위기는 기다리지 않고 계속 더해집니다. 기후, 생태 소식도 알아야겠죠?
살아지구가 국내외 소식을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린 뉴스레터 기훗기훗은 매주 발행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훗기훗을 보면 기후위기, 생태위기 관련 흘러가는 소식을 알 수 있게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기훗기훗 메일 오면 꼭 눌러보기! 매주 메일로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게 메일 등록은 필수!(희망사항)
❇️혹독한 겨울 앞둔 산양, 교사들이 알린다
= 경향신문 12월 10일
전국의 환경에 관심 많은 교사들이 멸종위기 동물 산양과 관련한 수업을 12월 18일에 실시합니다. 전문가를 불러 영상을 통해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왜 산양일까요?
산양은 깊은 산 속에서 가파른 바위를 오르내리며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다리가 짧아 눈이 많이 오면 많이 죽은 채 발견되곤 합니다. 원래도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산양의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몸에 가진 멧돼지가 돼지농장에 병을 옮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친 울타리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산양의 생존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에 폭설이 오면서 적어도 1042마리가 죽었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것만 셌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죽었을 거라는 예측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국에 산양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조차 없어서, 얼마나 큰 피해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매우 많은 수가 죽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자연의벗'이라는 환경단체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이라는 교사 단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려 하는 겁니다.
❇️기후위기에 무관심·무능한 한국언론, ‘기후악당’의 조력자
= 한겨레 12월 11일
한겨레가 올해 11월에 열린 '기후총회'에 국내 언론이 2명의 기자만을 등록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후총회는 각국 정부가 모여 앞으로의 환경 정책을 논의하고 세계적 합의를 하는 행사입니다. 'COP'라고도 부르고, 몇 번째 회의인지를 COP 뒤에 숫자로 붙입니다.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기후총회는 29번째이기 때문에 COP29였죠.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은 한겨레 기사를 통해 “몇몇을 제외하면 국내 언론은 대체로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위협인 기후위기를 그 엄중함에 걸맞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재난 등 사건 중심으로만 반짝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훗기훗 한마디
기후위기 문제에서 언론의 역할은 상당하죠.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보도에 나서지 않는 언론들을 향한 한겨레의 지적은 따갑네요.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세요
= 워싱턴포스트 12월 1일
플라스틱 물병이나 식기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또 플라스틱 반찬통처럼 식기가 플라스틱인 경우도 있어요. 살아지구 기자도 어디선가 받은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물통 같은 게 튼튼한데 버리기 아까워서 씻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셰리 메이슨이라는 미국의 플라스틱 전문가는 플라스틱을 계속 쓰면 몸에 안좋은 화학물질이나, 플라스틱이 아주 작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는 불이 잘 붙지 않게 하는 등 여러 목적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넣는데요. 화학물질만 해도 16000종류에 달한다는 게 메이슨의 연구결과입니다. 이 중 4200종류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메이슨은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절대 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등 뜨겁게 만들면 화학물질이 빠져나올 위험이 크다는 건데요. 뜨거운 음식을 바로 테이크아웃용 용기에 담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기훗기훗 한마디
다만 국내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는 어떤지 실험 결과가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전기차 전환, 대기오염 중국과 인도에 집중 경고
= 프린스턴대학교 12월 16일
흔히 우리들은 전기차로 바꾸면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만들 때도, 전기차를 충전할 전기를 생산할 때도 오염물질이 발생하죠.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중국과 인도에 집중될 거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린스턴대 연구진은 전기차의 배터리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경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 집중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때문인데요.
전기차 배터리에는 배터리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전기를 만들어내는 리튬이온이라는 물질이 있고, 이 리튬이온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전해액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액체인 전해액에서 이산화황 기체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산화황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생길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그래도 항상 공기질이 나빠 주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중국과 인도는 배터리까지 자국 내에서 직접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가 매우 많은 두 나라에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난다면 배터리 생산도 늘어날 거고, 대기오염도 이 지역에 집중되겠죠. 그래서 프린스턴대 연구진은 이산화황을 배출시키지 않는 방식의 배터리 제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연구 내용은 '환경과학 및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이라는 학술지에 'Multisectoral Emission Impacts of Electric Vehicle Transition in China and India'라는 제목의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기훗기훗 한마디
이런 현상은 남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사는 우리도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옮겨와 지금보다 많은 공기 오염 피해를 겪게 될 겁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절반 정도가 외국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이산화황을 피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양보호구역'과 '어민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동남아시아
= 더가디언 12월 11일
팔라우는 태평양 북서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잘 살아있는 나라죠. 팔라우 정부는 2009년 팔라우 근처 모든 바다에서 상어 낚시를 금지했고, 2014년에는 근처 바다 면적 80%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해양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건데요. 해양 생태계와 풍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양 보호를 중점으로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더가디언의 인터뷰에 응한 한 팔라우 사람의 말에서 그 걱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코로르라는 도시에 사는 한 주민은 "팔라우 해역 80%가 해양보호구역이라면, 저는 어디서 물고기를 구하죠?"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팔라우 외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해양 개발 혹은 대규모 어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양 개발을 통해 심해를 탐사하고 바다에 있는 광물들을 채굴하려 하거나, 원래 낚시를 금지했던 구역에서 다시 대규모 어업을 하려는 거죠. 나라에 속한 땅이 육지보다 바다가 많으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바다를 활용해야만 한단 논리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필리핀, 쿡 제도, 키리바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고민이 큽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거죠.
🐤기훗기훗 한마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바다 중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1인 당 수산물 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특성을 생각하면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합의'겠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요. 논의가 잘 이뤄질지 살아지구도 눈 부릅뜨고 살펴볼게요.
❇️해양보호구역 있을 때 어획량도 증가한다
= 미국 하와이대학교 12월 12일
해양보호구역은 어업과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양 자연환경을 잘 보전했을 때 어획량도 증가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이 원래 목적인 해양생물 보호는 물론 어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미국 하와이대학교가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연구진은 해양보호구역과 그 구역 근처 어획량을 비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인 하와이 북서부의 파파하모노쿠아키아 근처에서 참치 어획량이 10%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참치와 같이 바다의 여러 구역을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는 '회유성 어종'의 수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훗기훗 한마디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명태, 꽁치, 고등어 등도 '회유성 어종'이라는 점에서 해양보호구역의 잠재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태, 꽁치, 고등어들이 한국 바다에서 잘 잡히지 않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보호 조치'한 대서양참다랑어, 개체수 회복세
= BBC 12월 12일
우리가 흔히 '참치'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사실 여러 종류를 모아 부른 것입니다. 참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그 종류도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참다랑어'는 사는 곳에 따라 대서양참다랑어, 태평양참다랑어로 또 나뉩니다.
대서양참다랑어는 2010년에 멸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참치를 잡는 여러 국가와 국제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대서양참다랑어를 과도하게 잡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때 완전 유통 금지까지 추진했지만, 그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어쨌든 노력을 통해 대서양참다랑어가 멸종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전 세계 멸종위기 생물을 관리하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라는 국제기구가 2021년에 대서양참다랑어를 멸종위기종이 아닌 '최소관심(LC, Least Concern)' 단계로 지정했습니다. 2010년만해도 멸종위기 등급이 두 번째로 높은 '멸종위기(EN, Endangered)'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바다 수온이 많이 오르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온도에 민감한 대서양참다랑어도 살 곳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훗기훗 한마디
국내 기업인 동원, 사조가 전 세계 참치 생산의 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가짐이 참치 생산 방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기훗기훗 뉴스레터 재밌게 보셨나요?
혹은 보다가 거슬리는 게 있었나요?
살아지구에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press@disappearth.org

당신은 살아지구의 주춧돌
독자 후원으로만 운영하는 살아지구가 오래 살아남아 계속 보도할 수 있도록 주춧돌이 되어 주세요. 초기 후원자 50명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특별한 선물을 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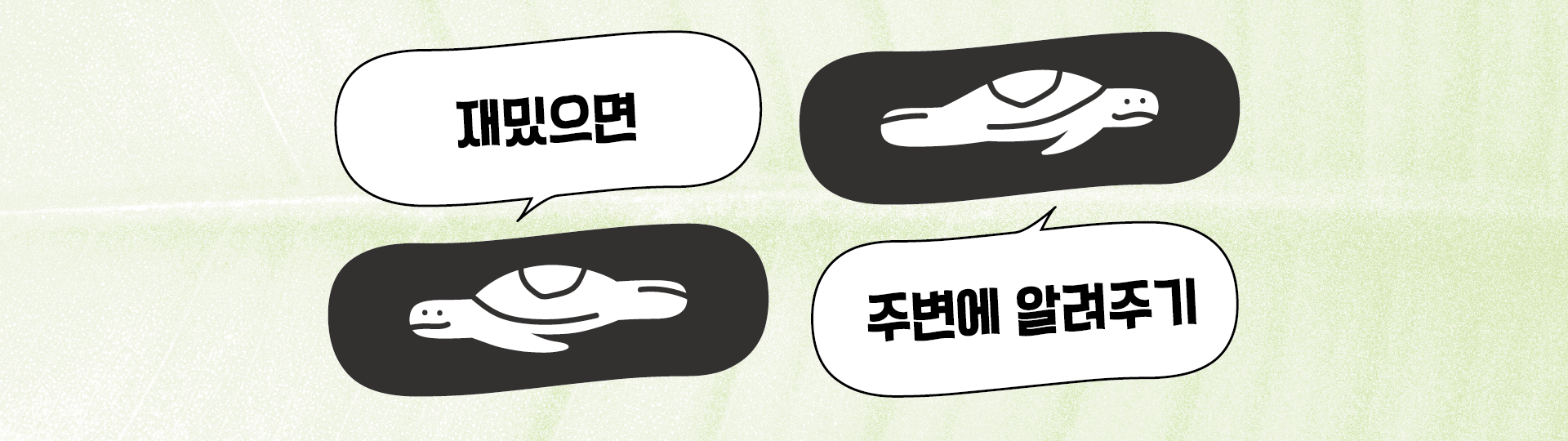
임병선 기자 bs@disappearth.org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