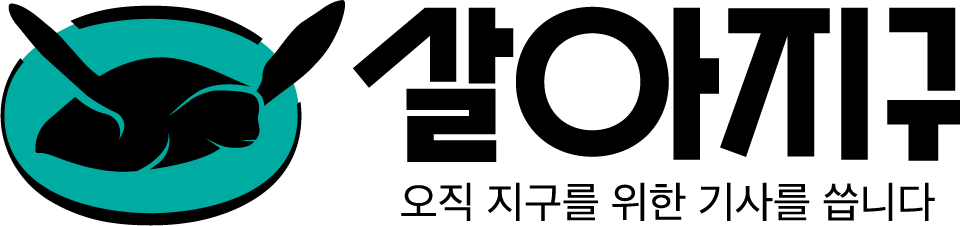해법은 명확한데 상괭이는 죽어간다
여느 때처럼 상괭이는 새우를 쫓는다.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새우는 쉽게 잡히지 않아, 상괭이는 숨이 차는 것도 잊고 지느러미를 열심히 움직인다. 상괭이는 방금 바다 위에서 숨을 쉬고 바닷속으로 내려왔으니 아무리 늦어도 2분 뒤에는 다시 바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 상괭이와 새우의 추격전이 벌어진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상괭이는 앞으로 갈 수 없다. 아래도, 옆도 막혔다. 그물에 걸린 것이다. 숨이 다해간다. 상괭이는 그렇게 죽는다. 죽은 상괭이는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놓인다. 사인을 밝히려는 수의사가 배를 갈라 장기를 들여다본다. 죽음의 원인은 질식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바다에서 혼획으로 죽은 상괭이는 321마리로 집계됐다. 혼획은 어업을 하면서 원래 잡으려던 조기, 오징어 등이 아닌 다른 생물이 죽는 일을 말한다. 어선이 던진 그물에 상괭이와 같은 밍크고래, 참돌고래 등 고래류가 잡히면, 해경은 일부러 잡은 것이 아닌지 확인한 뒤 ‘처리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혼획 마릿수를 집계한다.
연간 321마리라는 수치는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앞서 상괭이 혼획은 2019년 1464마리, 2020년 1072마리, 2021년 624마리, 2022년 384마리를 기록했다. 하지만 혼획 건수가 줄어든 게 상괭이라는 종 전체에게 청신호인지 적신호인지는 알 수 없다. 꾸준히 혼획으로 죽으면서 상괭이 전체 수가 줄어든 결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상괭이는 한국 바다에 사는 해양포유류다. 개체수가 줄고, 혼획에 희생되는 수가 많아 해양수산부는 2016년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전 세계 생물 멸종위기 등급을 관리하는 국제기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상괭이를 적색목록 취약종(VU, Vulnerable)으로 분류해 멸종위기종으로 본다.
한국에서 상괭이를 죽이는 가장 큰 원인은 안강망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상괭이 혼획 중 70%는 안강망에 의해 발생한다. 안강망은 어업 도구 중 하나로, 자루처럼 생긴 그물을 바닷속에 설치하면 물고기가 망 안으로 들어와 잡히는 구조다. 안강망으로 들어간 상괭이는 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질식해 죽는다. 상괭이를 비롯한 해양포유류는 어류와 달리 아가미가 아닌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다 위로 올라가 숨을 쉬어야 한다. 안강망 어업은 서해와 남해에서만 이뤄진다. 따라서 상괭이 혼획도 서해와 남해에서 심각하다.
안강망으로부터 상괭이를 구할 효과적인 수단은 이미 존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한 ‘상괭이 탈출 장치’다. 탈출 장치는 상괭이가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어종은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고, 상괭이처럼 큰 생물은 안강망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안강망 앞 부분에 설치한다. 원래 뚫려있는 안강망 입구 부분에 상괭이 출입 방지 망을 달아, 안강망 입구 위쪽에 상괭이가 지나갈 수 있는 작은 통로가 있는 형태다. 안강망에 이끌린 상괭이는 통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과 고래연구소가 이 탈출 장치 성능을 검증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확인됐다.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안강망 어선 30척에 탈출 장치를 설치해 성능을 시험했고 해당 기간 동안 상괭이 혼획 0건을 기록했다. 반면 탈출 장치가 없는 어선에서는 상괭이 혼획 52건이 발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 측 관계자는 “어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탈출 장치 설치 이후 상괭이 혼획이 확실히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탈출 장치 부착이 의무가 아니고, 어민이 탈출 장치를 사용하게 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물 제작 비용이 조금 더 드는 데다, 어획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라 어민들은 탈출 장치 사용에 부정적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 어민이 자율적으로 이 어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소 어민들은 해양수산부가 정한 표준을 기준으로, 각자 원하는 크기로 어구상사에 의뢰해 그물을 주문 제작한다. 탈출 장치가 달린 안강망은 선택지 중 하나인 셈이다. 자발적으로 탈출 장치가 달린 안강망을 쓰는 어민은 거의 없다.
해양수산부는 일부 의무화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으나 유명무실하다. 2025년 4월 기준 안강망 어선 19척이 탈출 장치를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협약’에 참여 중이다. 2021년 첫 협약 당시에는 64척이 참가했지만, 현재 냉동어선 19척 말고는 모두 협약을 포기했다. 국내 안강망 허가를 받은 어선은 2023년 말 기준 총 582척이다.
그나마 탈출 장치 사용을 의무화한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협약도 ‘엉뚱한’ 어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안강망 어업은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안강망으로 잡는 근해안강망과, 해안에서 떨어진 깊은 바다에서 잡는 연안안강망으로 나뉜다. 상괭이 혼획은 근해안강망보다는 연안안강망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근해안강망 허가 건수는 198척, 연안안강망은 384척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상괭이 탈출 장치가 달린 안강망은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5% 정도 어획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어획량은 어민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근해안강망 수협 목포지부 관계자는 “탈출 장치에 부정적인 어민 입장에서는 어획량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어획량 일부 감소에 보완책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해연구소 측 설명에 따르면 상괭이 탈출 장치가 달린 안강망의 경우 일반 안강망과 달리 일부분에 가는 그물을 쓸 수 있다. 덕분에 어민이 안강망을 펼칠 때 일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민이 어획량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비용 부담을 덜 탈출 장치 지원 제도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단 상태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2021년 어민에게 탈출 장치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했지만, 이후로는 관련 사업이 없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량 감소를 우려해 탈출 장치를 쓰지 않는 어민이 있다고 판단해, 어획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탈출 장치를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어획량 감소를 아예 없애고 탈출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 가능하지만, 탈출 장치는 상괭이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때문에 어획량 손실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어민들의 인식이 상괭이 생존의 관건이라는 의미다. 단속이 어려운 어업 특성상, 자율 참여가 아니라 의무화를 하더라도 결국 현장에서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의미가 있다.
<살아지구>는 추가 보도를 통해 안강망 어업 현장에서 상괭이 탈출 장치 보급을 위해 어민을 설득할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임병선 기자 bs@disappearth.org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