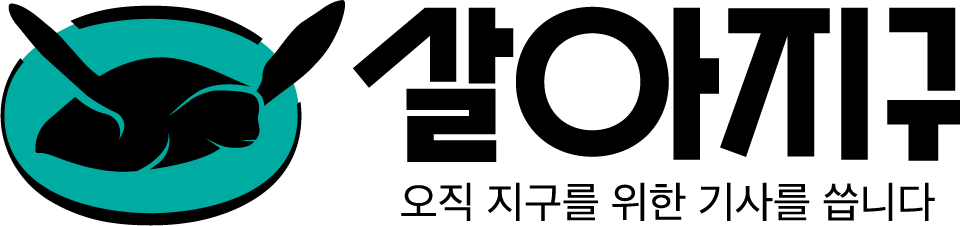연안침식 방지 위한 공사가 또 다른 침식을 낳다
강원도 삼척시 원평해변 바로 앞에 있는 매원리 마을은 2020년 2월 날벼락 같은 일이 닥쳤다. 큰 파도가 닥치면서 마을과 해안에서 오는 파도를 막아주는 소나무밭 3분의 1이 깎여 나간 것이다.
이 침식으로 해안을 따라 성업 중이던 펜션들도 초비상이 됐고, 이 지역 명물인 레일바이크의 철로도 무너져 멈춰 섰다. 다음에는 더 큰 파도가 마을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공포마저 일었다.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인 매원리에는 2022년 11월에서야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정비사업을 벌여 해수욕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360m짜리 이안제와 330m 길이의 돌제를 만들었다. 이안제는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짓는 방파제, 돌제는 모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해안과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는 방조제다. 이 공사에 약 8만 6천여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부었다.
3년이 지난 올해 6월 24일, 원평해변의 모래사장은 소나무밭에서 약 20m 떨어진 곳까지 무사했다. 모래사장은 여전히 깎아내렸지만, 소나무밭 앞까지 모래가 사라졌던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여전히 소나무숲 모래가 무너지지 않게 망태로 싼 돌무더기가 튀어나와 볼썽사나웠지만, 그런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 소나무숲을 가로지르는 레일바이크 운영도 재개됐다.
매원리에서 평생을 보낸 한 90세 노인은 “나라에서 3년 잘 공사해서 예전에 모래 나간 곳까지 돌아왔어”라면서 “파도가 집에까지 안 올라올테니까 좋지. 그땐 소나무밭도 다 파여나갔는데”라고 <살아지구> 취재진에 말했다.
이렇게 매원리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으나, 이번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원평해변 앞 연안정비사업으로 원평해변과 이어져 있는 초곡해변과 문암해변에 침식이 심해진 것이다. 원평해변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초곡해변의 모래는 대부분 사라졌다. 또 태풍 때 파도가 치자, 마을 조합이 초곡해변과 문암해변에 걸쳐 운영하는 캠핑장을 떠받들던 외벽도 무너졌다. 지난 2024년 여름의 일이다.
이렇게 삼척 해안에서 모래사장이 사라지는 근본적 이유는 ‘궁촌항 증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희대학교와 경북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2019년 발표한 논문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항 방파제 확장 전, 후의 해안선 변화’에는 삼척 해안의 침식과 궁촌항과 연안정비사업의 영향을 설명한다.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궁촌항 방파제 확장 건설이 거의 완성된 2010년경부터 방파제로 인해 파도가 들이치지 않는 궁촌해변 해안선은 바다 쪽으로 크게 전진한 반면, 모래가 궁촌해변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남쪽에서는 해안선이 후퇴했다. 이때 원평해변보다 남쪽에 위치한 해변들은 궁촌항 증축의 영향이 없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궁촌항을 증축하면서 방파제를 해안 바깥으로 길게 빼는 공사를 했다. 이 때문에 2008년 11월부터 원평해변에서 심각한 침식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매원리 마을 주민들은 궁촌항 개발로 인해 해안침식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2014년 국가는 연관성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200~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원평해변의 침식을 막기 위해 돌제와 이안제를 설치하는 연안정비사업을 벌였는데, 정작 이 연안정비사업이 초곡해변과 문암해변 침식을 가속화했다.
경희대, 경북대 연구진은 궁촌해변과 원평해변 전면에 설치한 잠제의 영향으로 해저의 모래가 궁촌해변 및 원평해변 북부 쪽으로 이동해 이보다 남쪽에 있는 해빈들에서는 침식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빈을 보호하기 위해 잠제와 같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해당 모래사장은 보호되더라도 인근의 모래사장에서 새로운 침식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원평해변 연안정비사업이 초곡과 문암해변 침식에 영향을 준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초곡해변과 문암해변의 침식도 궁촌항을 증축하고 나서부터 시작되긴 했으나, 2024년에는 파도가 들이닥쳤다. 연안정비사업 이전에는 큰 파도가 닿지 않았던 곳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외벽이 무너진 후 마을조합은 캠핑장 북쪽 모래가 사라진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보수 공사를 했다. 자연 상태의 암반 위에 돌로 쌓아 경사면을 이루게 하는 ‘호안’ 공사였다. 그러나 여전히 캠핑장 아래 벽은 파손된 상태다.
캠핑장을 관리하는 문암마을 주민 권영주 씨는 고향인 문암마을에서 70 평생을 살았다. 그는 “궁촌항을 증축하고 난 뒤부터 침식은 계속 있었다”면서 “계속 침식돼서 보강을 해 둔 것인데 작년에 무너졌다”고 했다. 권 씨는 새로 쌓은 호안을 바라보며 “폭풍이 오면 저것도 힘들지”라고 말을 흐렸다.
권영주 씨는 바다를 가리키며 “저 앞에 바위 있죠? 저기까지 다 모래였어요”라고 했다. 지금은 캠핑장 바로 앞까지 파도가 들어오고 있었다. 초곡해변에 해당하는 북쪽은 모래사장이 전부 사라져 바위가 드러나 있다.
한국 동해안의 연안침식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보다는 항구나 해안도로 개발이 주된 원인이다.
민간 업체인 혜인C&E 연구원들이 발표한 논문 ‘동해안 침식 원인분석 및 침식 영향도 평가’에 따르면, 동해안 연안침식 발생 지역 102개 해변 중 68개, 즉 67%가 해안 개발에 의해 발생했다. 다른 원인으로는 과도한 모래바다 채취, 해수면 상승 등이었다.
실제 해양수산부가 매년 실시하는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360개 해변 중 ‘우려’ 단계에 속하는 C등급 혹은 ‘심각’ 단계인 D등급인 해변은 절반 가까운 43.3%다.
그러나 정부는 궁촌항을 지을 때도, 원평해변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에게 미칠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궁촌항 증축이나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침식에 대한 설명 같은 건 있었느냐는 살아지구 기자의 질문에 권 씨는 “그때 뭐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하겠어요? 침식되는 것도 요즘 와서 시뮬레이션 해서 침식되겠다 하지, 그런 건 없었죠”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연안침식 방지 측면에세도 제도가 미흡하다. 예방보다는 피해 이후 대응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연안침식과 관한 국내 제도로는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사업, 연안침식관리구역, 연안침식 실태조사 등이 있는데, 모두 침식 발생 이후 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연안침식 가능성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으나, 연안침식에 대한 조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연안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동해안 연안정비사업을 책임지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원평해변 연안정비사업 시 초곡해변과 문암해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으나, 제도 상 명확한 평가는 어려웠다”며 “현재 초곡해변과 문암해변도 원평해변 연안정비사업과 비슷하게 구조물을 설치해 예방하는 공사가 계획돼 있다. 다만 마을 어업권 문제가 해결된 이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disappearth.org 메일 보내기